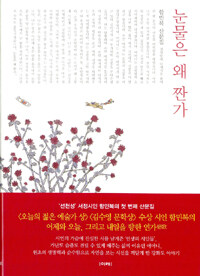 눈물은 왜 짠가 -  함민복 지음/이레 |
희미한 기억이나마 그의 소식을 기억하고 있어서였는지 ‘제비야 네가 옳다’를 읽으며 피식 웃었다. “강화도 우리 동네에는 이십여 호의 집이 있다. 그중 제비가 집을 짓지 않은 집은 빈집 두 집과 남자 노인이 혼자 사는 집, 그리고 역시 남자 혼자 사는 우리 집뿐이다.” 시인은 제비가 집을 지은 곳들이 제법 부러웠나보다.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묻어나는 외로움을 안다면 남달라 보이지 않는다. <눈물은 왜 짠가>를 관통하는 한 글자는 외로움이니까. 옛 사랑의 그림자, 기다림이 배어있던 어머니의 밥상을 주억거리며 시인은 참 외로워했다. 제비를 속이려고 TV를 크게 틀어 여자와 아이들 목소리도 내고, 여자 호르몬 냄새를 맡나 싶어 아는 후배에게 집에 한 번 놀러오라고 부탁까지 했다. 이 책을 처음 펼쳤던 그 무렵의 나도 비슷했다. 책장 한쪽을 접어둔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곳에서 나는 나를 만났다. “방 안에는 참 많은 내 친구들이 있습니다. 온몸이 입이라 소리만 들려주는 라디오가 있고 술 담배는 끊을 수 있어도 결코 끊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전화기가 있습니다. 또 내 감각기관 중 눈하고만 친구가 되는 벙어리 신문도 있고 말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티브이도 있습니다. 이 외에도 호출기를 비롯해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나는 외롭습니다. 방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나 혼자뿐입니다. 모두 안 움직이는데 혼자 움직이고 있다는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요.” - 새소리에 그림자와 외출한 어느 날. 신사동 어느 옥탑방에서 세 끼 밥 먹듯 외로움에 허덕일 때, 혼자 티브이를 보다 비슷한 생각을 했다.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고, 드라마 속 주인공들에게 몰입할 때가 아니면 집에선 다른 감정에 젖어볼 일이 없겠구나. 사람에겐 망각도 밥 먹는 일 같다. 그날들은 조금씩 아득해져간다. 워낙 표제작이 유명하고, 가슴 절절한 글인지라 나 역시 ‘눈물은 왜 짠가’를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글로 외웠던 것 같다. 다시 만난 함민복의 외로움들은 낯설다. 그 낯선 외로움들이 오히려 마음에 남는다. 돼지 자궁에 손을 넣은 채 걸려온 옛 사람의 전화, 자본주의 사회 속 산소발생기 은행 안에서 저 혼자 숨가빠하는 모습들, 소젖 짜는 기계 만드는 공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천천히 먹던 마지막 밥 한 그릇, 그리고 찬밥과 어머니. 시인은 “당신의 심장은 나의 오른쪽 가슴에 뛰고/ 끝내 심장을 포갤 수 없는/ 우리 선천성 그리움이여”라고 노래했다. 선천성 그리움은 어쩔 수 없지만, 당신의 심장을 나의 오른쪽 가슴에서 느낄 수 있다면 조금 나으리라. 섬마을 시인의 집에는 이제 제비가 찾아올지 궁금해졌다. |
'너는 내 마음에 남아 > 보고 듣고 읽고 쓰다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흥미로운 논쟁 하나 (0) | 2014.04.27 |
|---|---|
| 법의 얼굴 (0) | 2014.04.13 |
| '사실'과 '개인' 사이에서 (0) | 2014.01.02 |
| 당신에게 묻는다 (0) | 2013.04.08 |
| "만약 당신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" (0) | 2012.11.04 |

